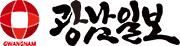|
| 길강묵 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행정학 박사) |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것은, 광주가 단지 근무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새로 배우게 한 ‘가치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 첫발을 디뎠을 때, 광주에서는 낯섦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의 일상 속 태도와 공동체의 신뢰가 낯선 이를 자연스럽게 이웃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 경험은 행정이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교본이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광주를 찾은 국내외 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찾았다. 전일빌딩과 ACC, 호남신대 선교사 저택에 남은 환대의 기억은 광주가 민주주의와 세계성을 함께 길러온 도시임을 또렷이 보여주었다.
그렇게 같은 길을 되짚은 횟수만도 서른 차례를 넘는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탄 자국이 남은 외벽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이었음을 말했고, ACC의 열린 광장에서는 광주가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 대화하는 도시임을 설명했다. 전일빌딩의 상흔과 망월동의 고요, 그리고 ACC에 흐르는 일상의 풍경은 행정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무언의 교과서였다.
광주는 늘 ‘국가란 무엇이며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게 했다. 이 도시에서 이민행정은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을 넘어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과제와 마주한다.
지난 1년,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새로운 시민을 맞이했다. 그 순간은 서류를 건네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 책임과 가치의 시민공동체로 확장되는 장면이었다. 민주화의 굽이마다 청년과 시민이 함께했던 광주라는 공간에서 국적을 수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선언처럼 다가왔다. 이는 중앙의 제도와 지역의 실천이 맞물리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현장이었다.
고려인마을의 골목을 걷던 날도 잊히지 않는다.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눈빛에는 조국을 향한 오래된 그리움과 오늘을 살아내는 결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정착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성의 문제다. 이민정책은 체류 관리에 머물지 않고, 국적 취득·교육·주거·일자리·지역 참여로 이어지는 연계고리를 설계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지금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AI와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국가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만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살 만한 공동체’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기억을 자산으로 시민성을 길러온 도시이며, 그 힘으로 새로운 전환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
“돌은 다듬을수록 빛나고, 공동체는 품을수록 강해진다.” 이 문장은 광주에서 체득한 진실이다. 도시는 떠나지만, 광주가 가르쳐준 것은 오래 남는다. 낯섦을 감싸 안던 따뜻한 정서, 다름을 품는 환대,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미래의 감각. 가장 아픈 역사가 가장 성숙한 시민성을 낳아온 도시, 광주가 광주답게 더 큰 나라의 내일을 비추는 등불로 남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며 떠난다.
 2026.03.05 (목) 06:22
2026.03.05 (목)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