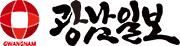|
| 채문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
요즘 관객의 취향은 더 세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졌고, 전시도 이런 차이를 존중할수록 각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가 한 번에 시선을 끌어당긴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걷고, 멈추고, 다시 읽을 수 있는 전시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ACC는 ‘뉴스트(NEWST)’라는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전남에서 일정 기간 활동해 온 작가들을 발굴해 관객이 ACC에서 처음 마주치는 전시장에서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NEW)’은 작가의 나이나 경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작가가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익숙한 풍경을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들고, 무심히 지나치던 이야기에서 시선을 붙잡는 장면 하나를 끌어올리는 힘. 그 힘이 뉴스트가 말하는 ‘새로움’에 가깝다.
뉴스트가 열리는 전시7관은 관람객이 ACC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전시장이다. 말하자면 ACC 전시의 ‘첫 문장’이다. 첫 문장은 짧고 분명해야 한다. 어렵고 긴 설명보다 ‘이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소개가 먼저 와야 한다. 첫 문장이 좋으면 관객은 ACC를 믿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불친절하면 ACC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쉽다. 그래서 전시7관에서 만나는 뉴스트 전시는 ‘환대’라는 의미로 읽힌다. 가로·세로 12미터 안팎의 공간이어서 작가와 작품을 가까이 마주하고, 하나하나 첫인사를 나누듯 작품을 보며 숨을 고르게 된다. 그러면 남은 ACC 전시들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결국 ‘왜 지금 ACC에서 전시7관을 새로 선보이는가, 왜 작가를 만나는 전시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전시는 문을 나설 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만남’이 ‘다음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관객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비평가와 협력 기관의 연결을 통해 작가의 다음 행보가 이어질 때 전시는 의미를 갖는다.
새로움은 화려한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작가가 오래 쌓아 올린 생각을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정성껏 옮겨주는 과정에서도 새로움은 생긴다. 이런 번역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관객의 기억에는 ‘오늘 좋은 전시를 봤다’보다 ‘오늘 참 좋은 작가를 만났다’가 남을 것이다. 뉴스트가 이런 만남을 꾸준히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2026.03.05 (목) 06:22
2026.03.05 (목)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