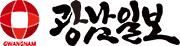|
|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 대우 |
최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음악분야 심사위원과 선정자가 직계혈족 관계여서다. 심사위원의 아들은 생애 최초 분야 지원대상 12명 안에, 딸은 청년예술인 분야 예비순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 기피서를 제출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문예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예술인이 ‘0’에 가까워 예비순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 실제 선정자는 1명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비순위 제도의 존재 이유를 짚어보면 ‘의미가 없다’는 해명은 역설적이다. 예비순위를 뽑는 것은 누군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사업 포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예비 순위에 오른 결과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인가.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 탈락자들에게 예비순위는 단순한 차순위 이상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는 자리, 다음 기회를 준비해볼 최소한의 신호 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예비순위의 상징성과 공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한 단계의 기회라도 더 줄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없었는지 묻게 되는 이유다.
문화행정은 규정과 시스템 위에 작동 하기에, 제도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해명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숫자와 규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창작의 세계는 신뢰 위에서 유지되고, 그 신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형성된다. 심사에서 ‘이해관계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드리운다면, 결과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해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지호 화백의 선택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들의 기회를 제한했지만, 그 판단은 한국 미술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선택으로 남아서일 터다. 현재의 문화행정이 반드시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예술 지원을 둘러싼 공정성의 기준은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라 ‘의심받을 여지가 남지 않느냐’에 더 가까워야 한다.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 어디까지 투명해야 하고, 예비순위와 같은 장치가 어떤 철학 위에서 운영돼야 하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26.03.04 (수) 20:30
2026.03.04 (수) 20:30